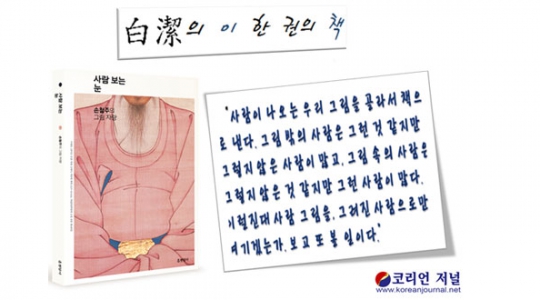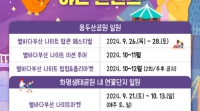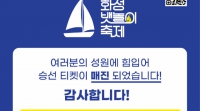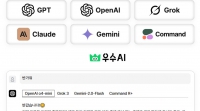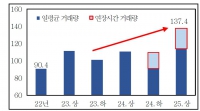[백결의 이 한권의 책]
참 갑박한 세상이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을 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은 시대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옛 그림속에서 그림 속 사람의 낌새와 그림 밖 사람의 추임새까지 읽어내는 안목을 보여준다. 이번 주말에 겉만 따지는 시속에 『사람 보는 눈』을 읽고 ‘그림 보는 눈’을 밝혀 ‘세상 사는 맛’을 도탑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백결의 한줄평 : 단순한 감상이 아닌 옛 그림속에서 내면을 볼 수 있게 한 책?
백결의 점수 : ★★★★☆(why? 은근한 재미를 줘서)
백결이 감명깊게 읽었던 글 : “사람이 나오는 우리 그림을 골라서 책으로 낸다. …그림 밖의 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고, 그림 속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럴진대 사람 그림을, 그려진 사람으로만 여기겠는가. 보고 또 볼 일이다.”(why?그림뿐 아닌 인간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 사람 보는 눈 – 사람 볼 줄 모르는 시대에, 사람을 그린 우리 옛 그림을 찬찬히 살피다
미술평론가 손철주는 『사람 보는 눈』 서문(앞서는 글)에서 ‘더 나은 그림’이 왜 감동을 주는지 문답한다. “만든 것(그림)이 어떻게 감동을 주나요?” 그는 답한다. “생긴 듯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사한’ 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 테다. 본문(65쪽)에 좀 더 풀이한 설명을 붙였다.
“조선의 초상화는 ‘전신(傳神) 기법’을 큰 자랑으로 삼는다. 정신을 전달한다’는 얘기다. 모델의 정신까지 화면에 살려내는 이 기법은 눈동자 묘사에 성패가 달려 있다. ‘눈은 정신을 빛내고 입은 감정을 말한다.’ …우리 초상화는 어떤가. 색은 칠한 둥 만 둥, 붓질은 듬성듬성, 게다가 작은 종이나 천에 그려 압도하는 위용이 없다. 그렇다면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는가. 앞서 말한 ‘전신’, 곧 ‘이형사신(以形寫神)’ 에 있다.
‘얼굴을 통해 정신을 그리는’ 방식이다. 겉을 꾸미느라 속을 놓치는 초상화는 허깨비 인물상에 머문다.”
사람을 그린 옛 그림들을 한 데 모아놓은 이 책에서 눈길을 붙잡는 것은 이처럼 거죽(생김새)과 꾸민 티(매무새)에 인물의 풍상과 속내까지 배게 그려낸 초상화의 힘, 즉 ‘본질을 잡아내는 사람 보는 눈’의 탁월함이다. 그러한 초상화를 읽어내는 저자의 ‘그림 보는 눈’도 되우 원숙하다.
가령 〈운낭자 상〉에서 당코 저고리의 동정과 치마 끝에 살포시 내민 흰 버선발을 주목하거나(20쪽), 〈송인명 초상〉의 뻐드렁니에서 포용력을 읽어내거나(65쪽), 〈이하응 초상〉에서 칼집에서 뺀 칼에서 대원군의 서슬을 읽거나(78쪽), 〈심득경 초상〉의 붉은 입술에서 그린 이의 애통함을 읽거나(102쪽), 〈임매 초상〉에서 ‘캐캐묵은 사람’의 심지를 읽어내거나(109쪽), 〈정몽주 초상〉에서 사마귀를 통해 인물의 체취를 붙들거나(111쪽), 〈황현 초상〉의 사시를 여기저기 다 보는 겹눈으로 읽어내는 (129쪽) 등 인물의 존재감을 쏙 잡아채는 손철주의 심안(心眼)은 꽤나 실감과 흥을 준다.
■ 그림 보는 법 – 옛 사람들의 생김새와 매무새, 그 뜻과 마음씨… 그림 보는 눈이 확 뜨인다
이 책에는 모두 85편의 그림을 실었는데, 그중 70여 편이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화다. 인물과 더불어 어떤 소재를 다루느냐에 따라 산수 인물화, 고사(故事) 인물화, 풍속 인물화, 신선이나 초월의 세계를 그린 도석(道釋) 인물화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인물화의 백미는 단연 초상화로 친다.
1부 「같아도 삶 달라도 삶」은 여인 초상화를 중심으로 고사 인물화와 도석 인물화를 주로 소개하였다. 어여쁘게 치장한 여인네, 교양이 풍기는 책 읽는 부인, 야무지게 입을 오므린 근엄한 사대부 여인, 조신하고 당당한 스물세 살 여인의 심지가 아련하게 다가온다. 여기에 그리다 만 듯 쓱쓱 그은 붓질로 표현한 〈삿갓 쓴 사람〉, 서늘하고도 맑은 신선과 검선(劍仙), 승려의 그림들은 ‘덜 그려도 다 그린 그림’들의 단순하고 담백한 경지를 보여준다.
2부 「마음을 빼닮은 얼굴」에 등장하는 23편의 초상화들은 오래가는 초상의 힘이 무언지 일러준다. 대상의 생생한 주름과 섬세한 의복은 물론 인물의 허풍과 겸양, 고집과 기골, 매운 눈초리와 무거운 입술, 꼿꼿한 차림과 생색내는 장식 등까지 꼼꼼하게 묘사한 조선의 초상화들은 ‘얼굴은 마음을 닮고, 사람의 일은 얼굴에 새겨진다’는 것을, 즉 ‘실존이 본질이 되는’ 우리 그림의 경지를 보여준다. 이를 찬찬히 읽어내는 손철주의 ‘그림 보는 눈’은 덩달아 독자의 그림 읽는 눈을 밝혀준다.
3부 「든 자리와 난 자리」는 풍속 인물화의 소박한 세계를 보여준다. 주요 화가는 단연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단원의 풍속화들은 정겹고 따습고, 혜원의 야릇한 그림들은 정답고 뜨겁다. 여기에 사람살이의 잔정과 설움이 비쳐 그립기도 하고, 늙은 음심과 젊은 난봉기질이 쑥덕여 망측하기도 하다.
4부 「있거나 없거나 풍경」은 산수 인물화 몇 점과, 인기척이 없는(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림 10여 편을 담았다. 친숙한 산수 인물화 또한 우리네 시선과 소망을 담은 심상인데, 흐르는 강물과 가을 달빛, 온 산의 홍엽과 적막한 겨울 풍경을 보고 ‘가슴에 멍든 이 누굴까’ 묻는 지은이의 설움이 낯설지 않다. 그러니 꽃, 포도, 원숭이, 닭, 기러기 그림이 사람 마음 그린 그림임을 쉬이 알겠다.
■ 세상 사는 멋 -‘오늘 사람은 옛 달을 보지 못해도/ 오늘 달은 일찍이 옛 사람을 비추었지’
“단원과 혜원의 진면목이 그러하듯이 조선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풍속화는 은근한 에로스가 진국이다. 다소 싱거운 듯해도 자극을 걷어낸 담박한 맛이 일품이다. 봄은 덧없다. 오는 듯 가버린다.
그 찰나적 황홀이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봄날의 상사는 누가 말려도 핀다. 그래서 사랑은 가없다.
조선의 풍속화는 봄날의 짧은 황홀과 아찔한 유혹, 남녀의 가녀린 떨림과 끌림을 담는다.
되바라지지 않게 묘사된 사랑의 풍속화, 그것이 남녀의 춘정을 바라보는 우리네 오래된 서정주의다.” _211쪽
‘버들가지 물오른 봄날’에서 시작해 ‘한 해가 오갈 때 보는 그림’으로 여닫는 『사람 보는 눈』은 시절의 오고감만큼이나 보편적인 삶의 그리움을 담은 책이다. 여기에는 옛 사람들의 얼굴과 차림새, 옛 풍속과 정취, 우리네 언어와 사연, 조상의 뜻과 마음씨가 들어 있다. 지은이는 사대부의 체통과 여인네의 은근함, 남부여대 행상의 남루한 밥벌이와 노는 이들의 느긋함, 기생의 수작과 은사의 고독, 윤기 흐르는 수박과 토실토실한 암탉 그림에서 우리네 오래된 정한을 읽는다. 그림 보는 까닭이 뜻밖의 즐거움과 조용하고 따스운 위로를 찾아서라면, 이 책은 요즘처럼 ‘내남없이 엉덩이 가볍고, 입살 세고, 들고나기 바쁘고, 도무지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게 생겨먹은 번다한 시절’에서 발을 빼 쉬어갈 만한 ‘대나무 화로가 놓인 방’(261쪽)과도 같은 편안한 미술관이다.
■ 문장 읽는 맛 – 손철주의 살가운 문장을 또 얼마큼 기다려야 할까
“배우고자 하는 속은 같다. 열성만큼은 여자라고 숙지지 않았다. 이 장면이 본보기다.
독서하는 여인이 단독 캐스팅된 그림이다. 속화에서 주연급 여배우는 흔히 기녀다.
보암보암에 이 여인은 사대부 권솔이다. 맵시에서 티가 난다.
올림머리 야단스럽지 않고 저고리 길이는 맞춤한데, 곁마기에 두른 회장이 단정하다.
파초 잎이 시원스레 드리운 여름 날, 가리개에 그려진 새는 마냥 조잘거린다.
개다리 의자에 앉은 그녀는 무릎 위에 책을 펴든다. 내려다보는 시선이 책에 붙박일 듯 끈지다.
고요한 독서삼매다. 얼굴이 곱다래서가 아니라 몸가짐에서 뱀뱀이까지 풍긴다.” _28쪽
이 넉넉한 책의 빼어난 재미는 역시나 손철주의 글 무늬에서 비롯된다. 부러 찾아 읽고 돌려 읽는 이 많은 그의 문장은 이 책에서 또 한 번 절창이다. 나긋하고 느긋한, 때로는 능청거리고 때로는 단호한 그의 짧은 문장은 예스럽되 감각이 푸르다. 당송 시대 한시로부터 오늘날 아이돌 그룹의 은어까지 박물학자와도 같은 전거, 아름다운 우리 고유어를 맛나게 구사하여 구성지게 읽힌다. 적당히 느린 탈것과도 같은 운율감, 여러 세대의 언어가 튀지 않게 스민 구어체, 절묘한 영탄과 적절한 익살은 다양한 연령의 독자와 공감대를 이루는 글쓰기로 손꼽히는 저자의 특장이다. 손철주의 깨끔하여 군더더기 없는 단문은 읽기에도 좋고, 특히 입말로 소리 내어 읽을 때 흥을 더한다. 『사람 보는 눈』을 읽고 말 그대로 곁사람들을 다정히 쳐다볼 일이다.
?[코리언저널 백결 ten@koreanjourn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