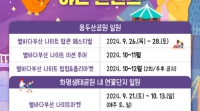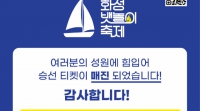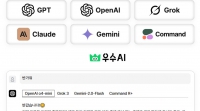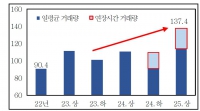[코리언저널 김소연기자 kj@koreanjournal.net
지난여름은, 8월 한 달은 가히 ‘<명량>의 달’이었고 ‘이순신 장군의 달’이었다. <최종병기 활>로 2011년 한국영화 박스 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던 김한민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인 <명량>은 한국 영화 흥행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화는 이 경이의 흥행 광풍은 ‘신드롬’이니 ‘현상’이니 등의 수식으로도 묘사 불가능할만했다.
이에《쿨투라》는 2014년 가을호 특집을, 일찍이 결정했던 ‘정도전 현상’에서 ‘이순신 신드롬’으로 전격 교체했다.
<명량>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념비적 대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 영화는 과연 그런 역사적 성공을 거둘만한 수준을 구현한 것일까? 그리고 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순신 열광’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덮게 된 것일까? 그 열광의 사회·정치·문화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이번호 특집에서 짚어보았다.
영화 평론가 김시무의 “민족주의라는 궁극의 이념을 기승전결이 잘 짜인 시각적 내러티브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관객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요점으로 <명량>의 기념비적 대 성공을 진단한 주장이 눈길을 끌긴 하나, 위 물음들에 대한 답변들을 오로지 영화의 힘만으로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졸작’이란 혹평이 아니더라도, <명량>의 작품성을 둘러싼 시비는 개봉 이후 줄곧 영화와 함께 해왔다. 당장 본지 편집위원 이재복만 해도, 김훈의『칼의 노래』와 비교해 영화에는 “인간적인 고뇌 혹은 내면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감을 표하며, 동의 여부를 떠나 영화에 비판적 시선을 던진다.
한편 이순신 특집 총론 격 견해를 피력한 김기봉 교수나, 감독을 인터뷰한 전찬일은 이재복이나 김시무와는 또 다른 주장을 펼친다.
김기봉 교수는 김시무와는 대조적으로,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구할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명량> 신드롬을 낳은 일차적 이유”라면서, “<명량>은 지금 우리의 이순신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기억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많은 대중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기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진단하다.
전찬일은 “‘대작’을 넘어 ‘거작’의 아우라! 성격화, 연기, 음악효과 등 사운드 연출, 극적 호흡, 주제의식 등 영화의 전 층위에서 최상의 수준을 일궈냈다. 사극영화, 해상여화 장르에서도 새 장을 열면서”라는 영화를 향한 극찬에서는 김시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적잖은 지점에서 김기봉 교수와 관점을 공유한다.
영웅을 넘어 성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인간 이순신(리더십)을 향한 흠모, 동경 등 ‘이순신 신드롬’을 전제하지 않고는 기적과 같은 <명량>의 흥행 성공을 설명은커녕 이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4인 4색을 읽는 맛이 꽤 달콤쌉싸름할 법하다.
비록 이순신에 밀리긴 했어도, KBS 정성효 PD의 범상치 않은 옥고「냉혹한 혁명가 혹은 비극적 영웅 서사·역사드라마 <정도전>의 세계」는 ‘정도전현상’이 특집으로서도 손색 없음을 웅변한다. “그 기저에 백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았던 소위 ‘민본정치’라는 이상을 실천하고자 했던 모습” 등 여로모로 이순신과 닮은꼴이나, 그 정치적 야심이나 “보수와 개혁, 이상과 혁명을 아우르는 사상의 넓은 자장” 등에서 어느 모로는 성웅을 훌쩍 뛰어넘었던 ‘거인’ 내지 ‘괴물’에 대한 흥미 만점의 스토리! 그리고 정 PD가 인용한 도올 김용옥의 평가가 정도전의 당대적 함의와 더불어 이순신과의 결정적 차이를 축약적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에 헌신하고 그 권력을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를 항상 갈망한다. 이러한 우리의 갈망에 부합되는 인물로서 우리는 삼봉 정도전을 뛰어넘는 인물을 우리의 역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공존을 추구하는 조각가, 임선빈”에 대한 윤필원의 입체적 인터뷰나, ‘결핍’의 견지에서 <군도>와 <명량>, <해무>, <해적>에 이르는 2014 여름의 네 국산 화제작을 짚은 영화 평론가 지승학의 ‘버티고’ 등 2014년 가을《쿨투라》에는 읽을거리들이 적잖다. 하지만 시대의 욕망을 반증하는 ‘이순신 광풍’이나 ‘정도전 현상’만으로도 일독에 값할 만하다.